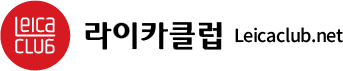다시 최민식을 본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명인
- 작성일 : 05-03-16 22:00
관련링크
본문
최민식선생의 사진에 조은 시인이 아포리즘을 붙인 책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에 대해서 어느 신문 한귀퉁이에 썼던 서평입니다.
* * *
한동안 최민식 선생의 사진을 잊어 왔었다.
오랫동안 좋은 사진의 기준이었던 그의 사진들을 잊었던 것은 언제부턴가 그의 사진에서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상투형의 기미를 읽었기 때문이다. 낡았다는 느낌, 그것은 그가 근년에 찍은 해외 취재의 사진들을 보면서 더욱 짙어졌었다. 50년대에서 70년대에 이르는 이 땅의 가난한 얼굴과 남루한 몸짓들을 찍던 그가 80년대를 지나면서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기 시작한 그 얼굴, 그 몸짓들을 가령 인도 같은 곳에서 다시 찾아내어 찍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아 여기까지가 최민식의 한계로구나’라고 생각했다. 이를 테면 자연주의 소설들의 한계와 같은 것을 최민식의 근년의 사진들에서 보았던 것이다. 세상은 30년 전까지와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고 그가 30년 이전에 보았던 보편적 가난과 남루는 이제 보편적 풍요와 화려함의 뒤안으로 숨어버렸다. 대신 다른 가난과 남루와 불행들이 세상을 떠돌았지만 최민식 선생의 카메라는 그 새로운 불행들을 찾아내서 포착해 내기에는 낡고 힘겨워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 오랜만에 다시 최민식 선생의 옛 사진들을 대하자 다시 가슴이 뭉클해져 왔다. ‘낡고 힘겨워진 것은 그가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하는 생각이 가슴을 쳤다. 그만큼 그의 옛 사진들에는 지금도 여전히 슬픔과 분노가, 연민과 공감이 결코 낡아질 수 없다는 듯이 생생하게 파동쳐 오고 있었다.
최민식 선생의 사진들에 조은 시인이 짤막한 아포리즘들을 붙인 새로운 최민식 사진선집ꡔ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ꡕ가 나왔다. 사진은 시와 가장 닮은 장르일지도 모른다. 생의 한 순간을 빛으로 인화지 위에 고정시킨다는 사진의 예술적 행동은 역시 생의 한 순간을 말로 종이 위에 고정시킨다는 시의 예술적 행동과 매우 닮아 있다. 그 절대의 순간 안에 생 전체를 담을 수도 있다는 것, 그 순간 사진도 시도 영원과 잇닿게 된다는 것, 사용된 빛이나 언어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며 그럴수록 더욱 뛰어난 예술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진과 시는 유사하다. 따라서 사진에 시 혹은 시적인 아포리즘을 덧붙이는 것은 시를 두고 시를 덧붙여 쓰는 일처럼 잘못하면 한 장의 사진이 지닌 풍부한 세계를 옹색하게 가두어두는 구속이 되거나, 쓸데없는 췌언이 되거나 기껏해야 동어반복에 머무르고 말 것이란 게 내 생각이다. 차라리 좋은 시 해설을 쓰듯, 좋은 산문을 덧붙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 아닐까.
아닌 게 아니라 이 책의 아흔 여덟 개의 사진에 붙여진 조은 시인의 아포리즘들은 정확히 시라고 할 수는 없어도 시적 절제를 여과한 짧은 줄글들이지만 바로 이런 사진 장르의 시적 특성 때문에 좋은 의도와 분명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다지 좋은 결과를 낳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이 책의 107면에 있는 극단적 노출기법으로 시멘트 벽에 기댄 채 울고 있는 남루한 아이를 찍은 사진에 대한 “태어날 때부터 배경이 어둠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아포리즘, 111면에 있는 쭈그리고 있는 중년 가장과 그 옆에 선 두 아이의 시선을 포착한 사진에 대한 “하지만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저 가족도 망망대해의 땟목처럼 흔들리고 있군요”라는 아포리즘, 그리고 179면의 기도하는 노파 사진에 대한 “구불구불한 길에 뒤덮인 저 육체! 산다는 것은 제 몸속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라는 아포리즘 등은 사진이 말하고 있는 것을 거의 적확하게 언어로 옮겨 놓았다고 해도 좋은 또 하나의 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테면 37면에 있는 삼줄 칭칭 감긴 커다란 야적용 천막 옆에서 리어카를 세워두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무언가 열심히 책을 읽는 노동자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더한 고독 속으로 자신을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지요”라고 쓰는 경우에 나는 그 아포리즘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 아마도 최민식 선생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왜냐면 그 사진은 프레임의 전체를 칭칭 감긴 삼줄이 차지하고 있고 책 읽는 노동자는 불안정하게도 왼쪽 하단에 내몰려 있음으로 해서 이 노동자의 지혜를 향한 나름의 열망이 얼마나 무력하고 불안한 것에 불과한 것인가를 웅변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76면에 있는 떠나는조각배를 여인네들이 배웅하고 있는, 최민식 선생 사진 중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시정 물씬 풍기는 사진들 두고 단지 “힘들게 일하며 떠나보내는 시간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해 버리는 것은 너무 상투적이고 반시적이다. 이 사진은 보내는 이들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떠나는 남루한 조각돛배의 실루엣이라는 소실점을 향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포착함으로써 그 자체로 단지 풍어의 기원이라는 말로는 절대로 형언할 수 없는 엄숙하고도 웅숭깊은 시적 정경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이런 사진과 아포리즘의 본질적 버성김은 이 외에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버성김에도 불구하고 이 독특한 사진집은 최민식의 사진세계를 요령있게 축약하여 한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존재의 의의를 갖는다. 가난과 슬픔, 남루와 분노, 노동과 힘, 절망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최민식의 인간애 가득한 앵글과 그를 뒷받침하는 절정의 셔터 감각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또 그에게도 가끔은 유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그가 90년대와 2000년대에도 다른 가난한 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깊은 연민과 통찰로 고통받는 존재들을 부감해 낸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히 훌륭하다.
* * *
한동안 최민식 선생의 사진을 잊어 왔었다.
오랫동안 좋은 사진의 기준이었던 그의 사진들을 잊었던 것은 언제부턴가 그의 사진에서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상투형의 기미를 읽었기 때문이다. 낡았다는 느낌, 그것은 그가 근년에 찍은 해외 취재의 사진들을 보면서 더욱 짙어졌었다. 50년대에서 70년대에 이르는 이 땅의 가난한 얼굴과 남루한 몸짓들을 찍던 그가 80년대를 지나면서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기 시작한 그 얼굴, 그 몸짓들을 가령 인도 같은 곳에서 다시 찾아내어 찍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아 여기까지가 최민식의 한계로구나’라고 생각했다. 이를 테면 자연주의 소설들의 한계와 같은 것을 최민식의 근년의 사진들에서 보았던 것이다. 세상은 30년 전까지와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고 그가 30년 이전에 보았던 보편적 가난과 남루는 이제 보편적 풍요와 화려함의 뒤안으로 숨어버렸다. 대신 다른 가난과 남루와 불행들이 세상을 떠돌았지만 최민식 선생의 카메라는 그 새로운 불행들을 찾아내서 포착해 내기에는 낡고 힘겨워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 오랜만에 다시 최민식 선생의 옛 사진들을 대하자 다시 가슴이 뭉클해져 왔다. ‘낡고 힘겨워진 것은 그가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하는 생각이 가슴을 쳤다. 그만큼 그의 옛 사진들에는 지금도 여전히 슬픔과 분노가, 연민과 공감이 결코 낡아질 수 없다는 듯이 생생하게 파동쳐 오고 있었다.
최민식 선생의 사진들에 조은 시인이 짤막한 아포리즘들을 붙인 새로운 최민식 사진선집ꡔ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ꡕ가 나왔다. 사진은 시와 가장 닮은 장르일지도 모른다. 생의 한 순간을 빛으로 인화지 위에 고정시킨다는 사진의 예술적 행동은 역시 생의 한 순간을 말로 종이 위에 고정시킨다는 시의 예술적 행동과 매우 닮아 있다. 그 절대의 순간 안에 생 전체를 담을 수도 있다는 것, 그 순간 사진도 시도 영원과 잇닿게 된다는 것, 사용된 빛이나 언어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며 그럴수록 더욱 뛰어난 예술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진과 시는 유사하다. 따라서 사진에 시 혹은 시적인 아포리즘을 덧붙이는 것은 시를 두고 시를 덧붙여 쓰는 일처럼 잘못하면 한 장의 사진이 지닌 풍부한 세계를 옹색하게 가두어두는 구속이 되거나, 쓸데없는 췌언이 되거나 기껏해야 동어반복에 머무르고 말 것이란 게 내 생각이다. 차라리 좋은 시 해설을 쓰듯, 좋은 산문을 덧붙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 아닐까.
아닌 게 아니라 이 책의 아흔 여덟 개의 사진에 붙여진 조은 시인의 아포리즘들은 정확히 시라고 할 수는 없어도 시적 절제를 여과한 짧은 줄글들이지만 바로 이런 사진 장르의 시적 특성 때문에 좋은 의도와 분명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다지 좋은 결과를 낳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이 책의 107면에 있는 극단적 노출기법으로 시멘트 벽에 기댄 채 울고 있는 남루한 아이를 찍은 사진에 대한 “태어날 때부터 배경이 어둠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아포리즘, 111면에 있는 쭈그리고 있는 중년 가장과 그 옆에 선 두 아이의 시선을 포착한 사진에 대한 “하지만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저 가족도 망망대해의 땟목처럼 흔들리고 있군요”라는 아포리즘, 그리고 179면의 기도하는 노파 사진에 대한 “구불구불한 길에 뒤덮인 저 육체! 산다는 것은 제 몸속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라는 아포리즘 등은 사진이 말하고 있는 것을 거의 적확하게 언어로 옮겨 놓았다고 해도 좋은 또 하나의 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테면 37면에 있는 삼줄 칭칭 감긴 커다란 야적용 천막 옆에서 리어카를 세워두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무언가 열심히 책을 읽는 노동자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더한 고독 속으로 자신을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지요”라고 쓰는 경우에 나는 그 아포리즘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 아마도 최민식 선생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왜냐면 그 사진은 프레임의 전체를 칭칭 감긴 삼줄이 차지하고 있고 책 읽는 노동자는 불안정하게도 왼쪽 하단에 내몰려 있음으로 해서 이 노동자의 지혜를 향한 나름의 열망이 얼마나 무력하고 불안한 것에 불과한 것인가를 웅변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76면에 있는 떠나는조각배를 여인네들이 배웅하고 있는, 최민식 선생 사진 중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시정 물씬 풍기는 사진들 두고 단지 “힘들게 일하며 떠나보내는 시간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해 버리는 것은 너무 상투적이고 반시적이다. 이 사진은 보내는 이들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떠나는 남루한 조각돛배의 실루엣이라는 소실점을 향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포착함으로써 그 자체로 단지 풍어의 기원이라는 말로는 절대로 형언할 수 없는 엄숙하고도 웅숭깊은 시적 정경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이런 사진과 아포리즘의 본질적 버성김은 이 외에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버성김에도 불구하고 이 독특한 사진집은 최민식의 사진세계를 요령있게 축약하여 한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존재의 의의를 갖는다. 가난과 슬픔, 남루와 분노, 노동과 힘, 절망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최민식의 인간애 가득한 앵글과 그를 뒷받침하는 절정의 셔터 감각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또 그에게도 가끔은 유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그가 90년대와 2000년대에도 다른 가난한 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깊은 연민과 통찰로 고통받는 존재들을 부감해 낸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히 훌륭하다.
추천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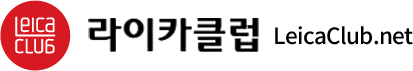
 회원가입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