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지락꼼지락 깨작깨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명기
- 작성일 : 09-08-23 14:49
관련링크
본문
꼼지락꼼지락 깨작깨작

새벽. 나는 아무런 준비 없이 잠들었을 뿐인데, 새벽은 홑이불을 파고드는 꼬마 고양이처럼 살그머니 다시 찾아왔다. 나는 눈을 뜬다. 조금 열려진 창으로 싸늘한 공기가 스며들어와 코끝을 갉작인다. 천천히 일어나 잠든 아내를 바라본다. 아내는 피곤한가 보다. 나는 이불을 끌어 올려 아내의 하얀 어깨가 진보라색 이불로 가려지는 것을 본다.
나는 소리 나지 않게 기지개를 한 번 켠다. 뼈마디에서 우드득! 작은 울림이 느껴진다. 오늘 아침, 나는 완벽하다. 아픈 곳도 욱신거리는 곳도 없다. 새벽인가? 내게 잘 잤느냐고 인사를 건넨 것은. 나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게 이불을 빠져 나와 계단을 내려간다. 발끝에 느껴지는 목재의 감촉. 아주 작게 속삭이듯 들려오는 나무 계단의 삐걱이는 소리. 나는 이 소리가 좋다. 나는 책을 들고, 서류를 들고, 커피 잔을 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나무계단을 오르내린다. 그리고 늘 생각한다. ‘감촉이 참 좋다.’
아래 층 창을 열자, 블록버스터 영화가 막 끝난 극장 문처럼 아침 공기가 쏟아져 들어온다. 어딘가 모를 검은 상념 속을 밤새 돌아다니던 공기다. 이젠 한낮이 열기가 빠지고, 차분해지고, 진흙 뻘처럼 부드러워진, 입자 작은 공기다. 나는 가슴을 잔뜩 부풀리고 마음 깊은 곳까지 공기를 빨아들인다. 새벽 공기는 이제 내 허파와 심장과 혈관과 마음속을 돌아다닌다.

이런 날에는 냇킹콜이다. 앰프를 켜자, 잠이 덜 깬 듯 머뭇거리던 진공관은 Siempre que te pregunto (난 항상 당신에게 묻곤 하지요.) 라고 해묵은 소리를 읊조린다. 나는 잠시 나무향같은 음색에 멈추어 있다. 매번 진공관이 Siempre que te pregunto 라고 낮게 웅얼거릴 때마다, 나는 뭔가를 발견한 꼬마 고양이처럼 우뚝 멈추게 되는 것이다. 시간은 아주 오래된 시점으로 나를 되돌린다.
나는 삶의 벽 앞에 서서 절망했다. 나는 모든 닫힌 문 앞에서 절망했다. 나는 나를 외면하는 눈동자 앞에서 절망했다. 나는 내게 신뢰를 버린 모든 것들 앞에서 절망하곤 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것은 결국 사랑이었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그 아픔들이 그리 길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그 모든 배신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의 미로에 빠져들지 않는다. 나는 전지를 바꿔 끼운 장난감처럼 다시 몸을 움직인다. 삶의 다른 모든 조각들처럼, 이것 역시 훈련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어둠을 헤치고 부엌으로가 커피를 끓인다. 작게 물이 솟아오르는 소리. 창밖엔 안개. 새벽의 거실 속을 천천히 돌아다니는 Siempre que te pregunto. 8월 말의 완전한 새벽. 나는 심호흡을 하고, 커피 향기가 유령처럼 흔들흔들 움직이는 짙은 새벽 속에 머물고 있다. 커피 잔을 손에 들고 나는 소파에 앉는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아침, 잠시 동안은 그렇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 미루어 왔던 일을 한다.
가방을 열고, 카메라를 꺼낸다. 부드러운 천을 무릎 위에 깔고, 렌즈를 분리한다. 미러를 올려 먼지를 턴다. 더스트 블로어를 쥐고 카메라 속의 먼지를 불어낸다. 렌즈 표면의 지문과 작은 흔적들을 닦고 불어낸다. 자꾸만 다가와 발아래 머리를 비비는 꼬마 고양이를 살짝 살짝 밀어내며, Sigma 30렌즈를 닦은 뒤 Tamron 망원렌즈를 닦는다. 필터를 열고 먼지를 털고 망원 조절 링과 거리 조절 링을 돌리며, 이 정밀한 기계장치가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가늠해 본다.
먹이를 나르는 개미처럼, 나는 꼼꼼하게 천천히 일을 한다. 이런 일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꼼지락꼼지락 깨작깨작해야만 하는 일이다. 카메라와 렌즈는 내가 본 것들을 시간 속에 고정시켜 준다. 나는 카메라를 닦으며 내가 본 것들을 하나하나 반추한다. 모두 이 새벽만큼이나 아름다운 풍경들과 환한 미소들이었다.

렌즈들과 카메라 파인더 뒤에는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반짝이는 내 눈동자가 있다. 내가 본 모든 것들은 카메라와 망막을 넘어 가슴 깊은 곳, 자작나무 숲에 소리 없이 내리는 눈처럼 차곡차곡 쌓일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몹시 고독한 날을 버티게 해줄, 소중한 기억과 추억으로 내 가슴 속의 갤러리에 전시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생각하겠지. ‘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야.’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의 햇살이 거실 벽에 밝아 오는 것을 바라본다. 나는 나이가 들어간다. 회귀연어 떼처럼 힘찬 몸짓으로 클럽에서 밤을 새우는 젊은이들이 보면, 지금 내가 하는 일과 모습은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따분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요 속 사소한 일상이 주는 즐거움은, 이 세상 어떤 빠른 것들보다 달콤한 기쁨이 있다. 새벽공기, 커피향, 냇킹콜의 Quizas Quizas Quizas, 카메라 닦기. 나는 꼼지락꼼지락 깨작깨작하며 나이 들어가는 내게 만족한다. 이런 건 괜찮다. 정말 괜찮다.
송화마을에서...
www.allbaro.com


새벽. 나는 아무런 준비 없이 잠들었을 뿐인데, 새벽은 홑이불을 파고드는 꼬마 고양이처럼 살그머니 다시 찾아왔다. 나는 눈을 뜬다. 조금 열려진 창으로 싸늘한 공기가 스며들어와 코끝을 갉작인다. 천천히 일어나 잠든 아내를 바라본다. 아내는 피곤한가 보다. 나는 이불을 끌어 올려 아내의 하얀 어깨가 진보라색 이불로 가려지는 것을 본다.
나는 소리 나지 않게 기지개를 한 번 켠다. 뼈마디에서 우드득! 작은 울림이 느껴진다. 오늘 아침, 나는 완벽하다. 아픈 곳도 욱신거리는 곳도 없다. 새벽인가? 내게 잘 잤느냐고 인사를 건넨 것은. 나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게 이불을 빠져 나와 계단을 내려간다. 발끝에 느껴지는 목재의 감촉. 아주 작게 속삭이듯 들려오는 나무 계단의 삐걱이는 소리. 나는 이 소리가 좋다. 나는 책을 들고, 서류를 들고, 커피 잔을 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나무계단을 오르내린다. 그리고 늘 생각한다. ‘감촉이 참 좋다.’
아래 층 창을 열자, 블록버스터 영화가 막 끝난 극장 문처럼 아침 공기가 쏟아져 들어온다. 어딘가 모를 검은 상념 속을 밤새 돌아다니던 공기다. 이젠 한낮이 열기가 빠지고, 차분해지고, 진흙 뻘처럼 부드러워진, 입자 작은 공기다. 나는 가슴을 잔뜩 부풀리고 마음 깊은 곳까지 공기를 빨아들인다. 새벽 공기는 이제 내 허파와 심장과 혈관과 마음속을 돌아다닌다.

이런 날에는 냇킹콜이다. 앰프를 켜자, 잠이 덜 깬 듯 머뭇거리던 진공관은 Siempre que te pregunto (난 항상 당신에게 묻곤 하지요.) 라고 해묵은 소리를 읊조린다. 나는 잠시 나무향같은 음색에 멈추어 있다. 매번 진공관이 Siempre que te pregunto 라고 낮게 웅얼거릴 때마다, 나는 뭔가를 발견한 꼬마 고양이처럼 우뚝 멈추게 되는 것이다. 시간은 아주 오래된 시점으로 나를 되돌린다.
나는 삶의 벽 앞에 서서 절망했다. 나는 모든 닫힌 문 앞에서 절망했다. 나는 나를 외면하는 눈동자 앞에서 절망했다. 나는 내게 신뢰를 버린 모든 것들 앞에서 절망하곤 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것은 결국 사랑이었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그 아픔들이 그리 길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그 모든 배신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의 미로에 빠져들지 않는다. 나는 전지를 바꿔 끼운 장난감처럼 다시 몸을 움직인다. 삶의 다른 모든 조각들처럼, 이것 역시 훈련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어둠을 헤치고 부엌으로가 커피를 끓인다. 작게 물이 솟아오르는 소리. 창밖엔 안개. 새벽의 거실 속을 천천히 돌아다니는 Siempre que te pregunto. 8월 말의 완전한 새벽. 나는 심호흡을 하고, 커피 향기가 유령처럼 흔들흔들 움직이는 짙은 새벽 속에 머물고 있다. 커피 잔을 손에 들고 나는 소파에 앉는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아침, 잠시 동안은 그렇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 미루어 왔던 일을 한다.
가방을 열고, 카메라를 꺼낸다. 부드러운 천을 무릎 위에 깔고, 렌즈를 분리한다. 미러를 올려 먼지를 턴다. 더스트 블로어를 쥐고 카메라 속의 먼지를 불어낸다. 렌즈 표면의 지문과 작은 흔적들을 닦고 불어낸다. 자꾸만 다가와 발아래 머리를 비비는 꼬마 고양이를 살짝 살짝 밀어내며, Sigma 30렌즈를 닦은 뒤 Tamron 망원렌즈를 닦는다. 필터를 열고 먼지를 털고 망원 조절 링과 거리 조절 링을 돌리며, 이 정밀한 기계장치가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가늠해 본다.
먹이를 나르는 개미처럼, 나는 꼼꼼하게 천천히 일을 한다. 이런 일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꼼지락꼼지락 깨작깨작해야만 하는 일이다. 카메라와 렌즈는 내가 본 것들을 시간 속에 고정시켜 준다. 나는 카메라를 닦으며 내가 본 것들을 하나하나 반추한다. 모두 이 새벽만큼이나 아름다운 풍경들과 환한 미소들이었다.

렌즈들과 카메라 파인더 뒤에는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반짝이는 내 눈동자가 있다. 내가 본 모든 것들은 카메라와 망막을 넘어 가슴 깊은 곳, 자작나무 숲에 소리 없이 내리는 눈처럼 차곡차곡 쌓일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몹시 고독한 날을 버티게 해줄, 소중한 기억과 추억으로 내 가슴 속의 갤러리에 전시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생각하겠지. ‘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이야.’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의 햇살이 거실 벽에 밝아 오는 것을 바라본다. 나는 나이가 들어간다. 회귀연어 떼처럼 힘찬 몸짓으로 클럽에서 밤을 새우는 젊은이들이 보면, 지금 내가 하는 일과 모습은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따분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요 속 사소한 일상이 주는 즐거움은, 이 세상 어떤 빠른 것들보다 달콤한 기쁨이 있다. 새벽공기, 커피향, 냇킹콜의 Quizas Quizas Quizas, 카메라 닦기. 나는 꼼지락꼼지락 깨작깨작하며 나이 들어가는 내게 만족한다. 이런 건 괜찮다. 정말 괜찮다.
송화마을에서...
www.allbaro.com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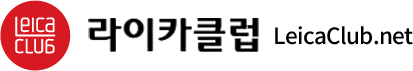
 회원가입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