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중'의 어원 - 믿거나 말거나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영주
- 작성일 : 07-03-29 19:37
관련링크
본문
갤러리를 둘러보다 보니, ‘땡중’의 사진들이 눈에 띄어 몇 자 적습니다
------------------------------------------------------------
한달 전,
병석에 계신 이 산하 시인(서사시-한라산 집필)을 병문안 가서는
밤을 세워 술잔을 기울인 적이 있씁죠.
“영주 사진 찍어?
절 사진 좀 찍어와, 땡중 사진.. 좋은 거 책에 넣게.”
아니, 이처럼 미스 박이 존경하옵는 인사(人士)께서 “땡중”이란 속어를 쓰시다니..
순간 실망을 했으나, 설마하는 마음으로 미스 박 밀고 나갑니다.
“선생님, 땡중이 무슨 뜻이니까?”
흑맥주 한 모금으로 혀를 축이시고는
“어, 땡중 나쁜 말 아니야.
옛날 조선시대 있었던 민중 승려 집단으로 ‘당취’라고 있었다네.
당취-> 당초-> 땡초->땡중으로 발음이 전해진 거지.”
하시며 당시 당초들이 핍박받는 민중의 편에 서서 활동했던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았다고 일러 주시더군요.
역쉬,,,,크하하 존경함돠. 쌤.
하고 저의 일편단심 민들레가 조각조각 바람에 날려 흩어지려는
상황을 모면했다는…
**아래 두 '땡중'에 관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발췌한 약간의 차이가 있는 해석입니다만,
이해를 돕고저…
-비오는 밤, 할 일없는 가시내 미스 박이여.ㅎ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1.
흔히 비속한 감정 표현을 드러낼 때 '땡초'라는 말이 있다.
옳게는 스님, 그냥 일반으로는 중(衆)이라는 말이겠지만, 대개는 그 스님을
괄시(괄시)하는 경우 주저 없이 '땡초'를 내뱉기가 일쑤다.
가령, 목사(牧士, 양치는 선비가 아니라 특정 종교적 사명을 업으로 하는 사람)를
가리켜 '양치기'라고 불러댄다면, 이를 꺼릴 사람이 분명 있듯이 마찬가지로 용어의 선은
기분에 죽고 분위기에 사는 우리 정서에 더더욱 예민하게 작용하게 된다.
무슨 종교를 가지고 씹어대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종교 없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말이다.
무종교 또한 종교다.
'땡초'는 맵기로 유명한 청양고추를 지칭하던 말이기도 했다.
'땡초' 혹은 '땡추'로도 일컬어지는데 그 어원은 '당취(黨聚: 떼, 무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전적 정의는 조선시대에 민가를 돌면서 동냥을 하던 탁발승(托鉢僧)에 대한 속칭(俗稱)
또는 멸칭(蔑稱)으로 되어 있는데, '땡땡이중’의 준말이라는 주장도 있다.
땡추로 불리던 무리들 중에는 민란(民亂)을 꾀하거나 돌아다니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들도 있었다.
실제로 조선 중기 이후 학문 또는 수행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의 변혁이나 역모(逆謀)를 꾀하여 뭉쳐진 비밀결사도 존재하였다.
조선의 억불숭유책(抑佛崇儒策)에 시달려 산 속으로 피해 간 승려들과
몰락한 양반계층의 자제, 또는 실정(失政)에 불만을 품은 선비 등
실로 다양한 계층의 무리였다.
특히 1504년(연산군 10년) 승과(僧科)가 폐지되고
도승(道僧: 승려 자격증인 도첩을 받은 승려)제도가 없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가짜 중이 급증하였다.
이들은 보통 10~20여 명씩 한 패가 되어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수행 •학업에 열중하는 승려들을 괴롭히고 먹거리 등을 약탈하는 등
한낱 부랑배 집단에 불과했다.
지역단위나 전국적 조직도 있어 조선 후기 빈번했던 민중봉기 등에도 무리를
이끌고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리산 땡추 출신인 김단야(金丹冶),
금강산 땡추이던 이충창(李忠昌)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또는 심신수련을 위해 산문에 모여 수행해야할 터전을 잃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속칭 '떼거리'로 전락하는 처지가 되고,
결국에는 스님이 땡초로 입질당하게 된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지금도 놀고 먹는 스님이나,
스님을 가장한 어중이 떠중이, 술 잘 마시고 호색하는 가짜 스님,
별 신통수 없는 점괘나 봐주며 시주(施主)나 바라는 스님도 땡초,
잿밥에 집착 긍긍하는 일반 중생도 다 땡초고,
사이비(似而非)적 망상가도 땡초, 허장성세하는 자 亦是 땡초다.
그러니 이제는 '땡초!'하고 생각 없이 내뱉다가는
자신 스스로에게 침 뱉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여자 아이에게 '가시내!' 하면 그 땡초한테 시집가라는 말이다.
'가시내'는 일부 지역의 방언이지만 가승내(嫁僧奈?)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고도 본다.
가승내(嫁僧奈)는 '중한테 시집 간다'는 뜻으로 비꼬거나 빈정대는 표현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2.
땡초 黨聚(당취)
땡초 또는 땡추는 계율을 어기고 제멋대로 다니는 스님을 말하는데
그 어원은 당취黨聚에 있다.
당취란 조선시대에 실제 있었던 승려들의 집단을 말한다.
당취는 산속에 모여 살면서 유생들이 스님에게 모욕을 가하거나 하면
단체로 몰려가서 혼을 내주고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구한말의 개혁세력에도 동참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식인들 속에
포함되기도 했다.
당취는 불과 2,30 여 년 전에도 존재할 정도로 결속력이 대단했던 모양이다.
당취란 권력에 기대어 사는 권력승의 무리가 아닌 핍박받는 민중의 편에 서서
활동했던 측면도 많아서 한편으로는 나쁜의미로 각인된 배경에는
유학자들이 승려집단을 폄하하고 권력의 변두리로 내몰게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도 숨어있음을 지나칠 수가 없다.
------------------------------------------------------------
한달 전,
병석에 계신 이 산하 시인(서사시-한라산 집필)을 병문안 가서는
밤을 세워 술잔을 기울인 적이 있씁죠.
“영주 사진 찍어?
절 사진 좀 찍어와, 땡중 사진.. 좋은 거 책에 넣게.”
아니, 이처럼 미스 박이 존경하옵는 인사(人士)께서 “땡중”이란 속어를 쓰시다니..
순간 실망을 했으나, 설마하는 마음으로 미스 박 밀고 나갑니다.
“선생님, 땡중이 무슨 뜻이니까?”
흑맥주 한 모금으로 혀를 축이시고는
“어, 땡중 나쁜 말 아니야.
옛날 조선시대 있었던 민중 승려 집단으로 ‘당취’라고 있었다네.
당취-> 당초-> 땡초->땡중으로 발음이 전해진 거지.”
하시며 당시 당초들이 핍박받는 민중의 편에 서서 활동했던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았다고 일러 주시더군요.
역쉬,,,,크하하 존경함돠. 쌤.
하고 저의 일편단심 민들레가 조각조각 바람에 날려 흩어지려는
상황을 모면했다는…
**아래 두 '땡중'에 관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발췌한 약간의 차이가 있는 해석입니다만,
이해를 돕고저…
-비오는 밤, 할 일없는 가시내 미스 박이여.ㅎ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1.
흔히 비속한 감정 표현을 드러낼 때 '땡초'라는 말이 있다.
옳게는 스님, 그냥 일반으로는 중(衆)이라는 말이겠지만, 대개는 그 스님을
괄시(괄시)하는 경우 주저 없이 '땡초'를 내뱉기가 일쑤다.
가령, 목사(牧士, 양치는 선비가 아니라 특정 종교적 사명을 업으로 하는 사람)를
가리켜 '양치기'라고 불러댄다면, 이를 꺼릴 사람이 분명 있듯이 마찬가지로 용어의 선은
기분에 죽고 분위기에 사는 우리 정서에 더더욱 예민하게 작용하게 된다.
무슨 종교를 가지고 씹어대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종교 없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말이다.
무종교 또한 종교다.
'땡초'는 맵기로 유명한 청양고추를 지칭하던 말이기도 했다.
'땡초' 혹은 '땡추'로도 일컬어지는데 그 어원은 '당취(黨聚: 떼, 무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전적 정의는 조선시대에 민가를 돌면서 동냥을 하던 탁발승(托鉢僧)에 대한 속칭(俗稱)
또는 멸칭(蔑稱)으로 되어 있는데, '땡땡이중’의 준말이라는 주장도 있다.
땡추로 불리던 무리들 중에는 민란(民亂)을 꾀하거나 돌아다니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들도 있었다.
실제로 조선 중기 이후 학문 또는 수행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의 변혁이나 역모(逆謀)를 꾀하여 뭉쳐진 비밀결사도 존재하였다.
조선의 억불숭유책(抑佛崇儒策)에 시달려 산 속으로 피해 간 승려들과
몰락한 양반계층의 자제, 또는 실정(失政)에 불만을 품은 선비 등
실로 다양한 계층의 무리였다.
특히 1504년(연산군 10년) 승과(僧科)가 폐지되고
도승(道僧: 승려 자격증인 도첩을 받은 승려)제도가 없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가짜 중이 급증하였다.
이들은 보통 10~20여 명씩 한 패가 되어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수행 •학업에 열중하는 승려들을 괴롭히고 먹거리 등을 약탈하는 등
한낱 부랑배 집단에 불과했다.
지역단위나 전국적 조직도 있어 조선 후기 빈번했던 민중봉기 등에도 무리를
이끌고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리산 땡추 출신인 김단야(金丹冶),
금강산 땡추이던 이충창(李忠昌)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또는 심신수련을 위해 산문에 모여 수행해야할 터전을 잃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속칭 '떼거리'로 전락하는 처지가 되고,
결국에는 스님이 땡초로 입질당하게 된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지금도 놀고 먹는 스님이나,
스님을 가장한 어중이 떠중이, 술 잘 마시고 호색하는 가짜 스님,
별 신통수 없는 점괘나 봐주며 시주(施主)나 바라는 스님도 땡초,
잿밥에 집착 긍긍하는 일반 중생도 다 땡초고,
사이비(似而非)적 망상가도 땡초, 허장성세하는 자 亦是 땡초다.
그러니 이제는 '땡초!'하고 생각 없이 내뱉다가는
자신 스스로에게 침 뱉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여자 아이에게 '가시내!' 하면 그 땡초한테 시집가라는 말이다.
'가시내'는 일부 지역의 방언이지만 가승내(嫁僧奈?)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고도 본다.
가승내(嫁僧奈)는 '중한테 시집 간다'는 뜻으로 비꼬거나 빈정대는 표현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2.
땡초 黨聚(당취)
땡초 또는 땡추는 계율을 어기고 제멋대로 다니는 스님을 말하는데
그 어원은 당취黨聚에 있다.
당취란 조선시대에 실제 있었던 승려들의 집단을 말한다.
당취는 산속에 모여 살면서 유생들이 스님에게 모욕을 가하거나 하면
단체로 몰려가서 혼을 내주고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구한말의 개혁세력에도 동참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식인들 속에
포함되기도 했다.
당취는 불과 2,30 여 년 전에도 존재할 정도로 결속력이 대단했던 모양이다.
당취란 권력에 기대어 사는 권력승의 무리가 아닌 핍박받는 민중의 편에 서서
활동했던 측면도 많아서 한편으로는 나쁜의미로 각인된 배경에는
유학자들이 승려집단을 폄하하고 권력의 변두리로 내몰게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도 숨어있음을 지나칠 수가 없다.
추천 0
댓글목록
이원용님의 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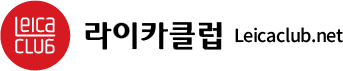 이원용
이원용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내요....
더군나나 "가시나"라는 말은....말의 어원이 약간은 충격적이네요...
흔히 쓰는 말도 어원을 찾다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많더군요...
민병윤님의 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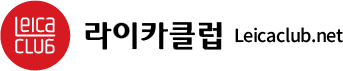 민병윤
민병윤
사진이 좋습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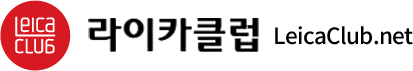
 회원가입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