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흥소설] 버쓰이어 (Birth-year) #2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현재덕
- 작성일 : 06-03-31 18:04
관련링크
본문
주인은 바뀌었어도 충무로 [53-22]의 커피맛은 그대로였다. 예전엔 일리(Illy)의 원두를 쓰다가 지금은 라바짜(Lavazza)의 '골드 셀렉션'으로 굉장히 강렬한 에스프레소를 만들어 낸다. 포토그래퍼이기도 한 전주인이 가끔씩 가게에 들러 커피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챙긴다는 얘기도 들렸다.
종범이 마시던 커피잔을 덜컥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은 것은 양지가 가방에서 꺼낸 반짝이는 은색 카메라 때문이었다.
"어,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나긴~ 샀죠~ 왜, 난 M4 사면 안돼요?"
예의 그 헤헤거리는 웃음을 입가에 매달고 양지가 웃었다. 종범은 말없이 손을 내밀어 카메라를 보자는 뜻을 전했다. 양지는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았다.
"보기만 해요. 손대진 말고. 내꺼니까. 헤헤"
카메라는 실버크롬 M4였다. 볼커나이트가 몇 군데 작게 떨어져나갔고 스트랩에 쓸린 측면의 자국이며 상판에 노출계 착탈 흔적이 제법 크게 있는 등 군데군데 흠이 있었지만, 세월을 감안하면 비교적 깨끗하다 할 만한 실사용기 상태였다
"돈이 어디서 나서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다 종범은 말을 멈췄다. 양지에게 돈 얘기를 하는 건 그녀를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언제나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양지는 전혀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다. 대학을 다닐 때도 친구들은 그녀를 유복한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막내딸이라고 생각했다. 옷 한 벌을 입어도 깔끔하고 센스있게 입고, 어떤 상황에서도 구김없고 밝은 표정의 그녀를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샀어요. 그냥 가지고 싶어져서"
양지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말했다. 가지고 싶어서 샀다는 데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M4를 가지고 싶어한 건 종범이었다. 다른 사람 앞에선 과묵해도 양지에겐 가끔씩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펼치곤 했다. 버쓰이어(Birth-year) 바디의 의미며, 라이카 M 라인업에서 M4가 차지하는 위치며, 소량 만들어진 블랙 페인트 바디의 아름다움이며.... 이런 얘기를 할때면 내성적인 종범의 얼굴에서 어떤 빛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양지는 느꼈다. 그리고 왜 종범이 그렇게 버쓰이어 바디에 집착하는지도.
"이거, 1969년에 만들어진 거에요"
어떤 감정이 실린 건지 종잡기 힘든 목소리로 양지가 말했을 때 종범은 놀라기보다 궁금해졌다. 이 철없는 아가씨가 왜 그토록 자신이 갈망하던 카메라를 들고 나타난 건지.
"아저씨에겐 버쓰이어 바디가 자신과 함께 나이 먹어가는, 함께 세상의 가장자리로 서서히 밀려가는, 그 속도를 눈물나게 실감하게 해주는 길벗이라고 했잖아요?"
종범은 대답 없이 양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나한테는 말이에요, 이 1969년산 카메라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남자의 모든 것, 그중에서 그 남자가 태어난 해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걸, 그 시간까지도 사랑한다는 걸 뜻하는 거에요"
종범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건 제가 가진 거에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만지지 마세요. 이건 아저씨니까. 아저씨가 아저씨를 만지는 건 이상하잖아....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게 되면, 내가 아저씨 길벗이 되면, 그때 아저씨한테 드릴께요. 그때 이 M4는 더 이상 아저씨가 아니라 아저씨를 선택한 나-에요"
그 사단이 있고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여자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종범은 어른인 자신이 뭐라고 정리하지 못하는 일을 스물다섯살 짜리 이 아이가 이렇게 단호하게 정리해버리는 게 놀라웠다. 그렇게 놀라고 나자 이번엔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식도 아래쯤, 명치께를 중심으로 확 퍼져나갔다.
이틀전, 양지의 어머니도 비슷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양지의 단호함은 핏줄을 타고 전해진 걸지도 몰랐다. 양지의 어머니는 세가지를 물었고, 종범은 서른 여덟살이다, 작은 중소기업 홍보실에서 일한다, 모아둔 큰 돈이나 특별한 인생계획은 없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었다. 양지의 어머니는 또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가난하다, 당신이 알고있는 것보다 세 배는 더 가난하다. 이 가난 속에서도 딸 하나 잘 키워 행복하게 해주리라는 기대가 우리 부부의 유일한 꿈이고 낙이었다. 그게 우리를 버티게 했다. 띠동갑 하고도 한 살 더 많은 남자, 그것도 모아둔 것 하나 없는 월급쟁이에게 맡기기엔 딸아이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무겁다. 그 무게는 우리 가족이 건 꿈의 무게다....
양지에게서 듣지 못한 말은 하나도 없었다. 들었던 그대로의 상황이고, 들었던 그대로의 어머니였다. 그런데도 종범은 이길 수 없었다. 조건이나 상황을 이길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가족이 걸고 있는 꿈의 무게를 이길 수 없었다. 그에 비하면 자칭 양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절대적격자- 성호의 억지는 들어줄 만 했다. 아, 그 녀석이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었지.....
"처음 뵙겠습니다. 슈펠타라고 합니다"
"네, 스카라고 합니다. 문종범입니다"
"동안이시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대충은 알고 있는데"
"네, 슈펠타님은 어떻게 되시는지.....?"
"82년생입니다. 양지랑 동갑입니다"
동.갑.이라는 말에 방점이라도 찍힌 것처럼 성호는 한자씩 또박또박 끊어 그 단어를 발음했다. 아니, 그건 종범에게만 들린 환청일지도 모른다. 좀전부터 현기증 비슷한 작은 충격에 깜짝깜짝 놀라던 종범은 정신을 다잡으려고 별 의미없이 카메라가방을 만지작거렸다.
"좋은 가방 쓰시네요. F6..... 역시 연륜이 느껴지네요. 돔케는 낡을수록 진국이라더니"
성호의 옆 의자에 놓여있는 가방을 보니 아티산&아티스트의 최신 모델이었다. 얇고 가벼운 천에 고급스런 가죽을 덧댄. 종범은 낡아빠진 자신의 F6를 한 번 보고 다시 성호의 A&A 가방을 한 번 보곤 하였다. 눈에 보이는 바깥쪽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안쪽을 드러낸다. 세상은 그런 상징의 총합이다. 종범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였다. 이 순간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종범은 억지로 고개를 흔들었지만, 한 번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생식세포의 무서운 속도로 증식하더니, 나중엔 머리 속을 가득 채울 만큼, 그를 통째로 잡아먹을 만큼 커졌다.
"무슨 생각 해요? 버쓰이어 바디에 홀렸어요?"
얄미운, 하지만 조금 걱정스러운 눈으로 양지가 물었다.
"아니"
거짓말 못하는 종범은 곧 덧붙엿다.
"성호 생각. 그냥."
이번엔 양지가 입을 닫았다.
커피가 하릴 없이 식어갔다. 아예 커피잔 손잡이까지 식어버렸다.
정작 해서 안될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니었다, 가난 이야기가 아니었다.
매번 그랬지만, 이번에도 종범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양지는 느릿느릿, 하지만 세밀한 손길로 가방에 M4를 집어넣고, 핸드폰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저씬 그렇게 오래 가지고 싶어했으면서도 아직도 버쓰이어 바디를 가지지 못했죠?"
"...."
"하지만 난 가지고 싶어하는 순간 바로 이렇게 가졌어요. 이게 아저씨와 저의 차이에요"
양지가 빠르게 말을 이었다.
".... 정확히 말하자면, 아저씨와 아저씨가 생각하는 가짜 아저씨의 차이에요. 아저씨가 아저씨 자신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껍데기일 뿐인 가짜 아저씨...."
종범이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양지가 말했다.
"아저씨는..... 내가 가지고 싶기는 해요?"
"어..... 너 무슨 말을 그렇게 막 하냐. 그걸 몰라서 묻니. 우린 당연히... 벌써..."
양지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같이 자는 거 말구요, 아저씨의 양심, 아저씨의 죄책감, 아저씨의 이성, 이런 거 다 놓고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싶냐구요"
"...."
"아저씬 나와 잘 순 있지만 나를 가지진 못했지요. 버쓰이어 M4를 가지지 못한 것처럼. 그건 늘 아저씨의 껍데기가 아저씨를 이기기 때문이지요"
양지가 야무지게 입술을 깨물었다.
"난 그걸 알아요"
양지가 휙 [53-22]의 문을 나섰다. 한동안 종범은, 눈 앞에서 사라진 게 양지인지, 실버크롬 M4인지 확신할 수 없어 반쯤 일어나다 만 어설픈 자세로 테이블을 짚고 서있었다. 갑자기 뱃속에서 말이 쏟아져 나왔다. 야!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스물다섯살 짜리가 어떻게 알아!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말을 한 바가지 넘게 쏟아내고야, 비로소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이 년 동안 단단히 붙잡고 있던 눈물이었다.
그때였다. 주인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실례지만 혹시....."
.......to be continued
(아래 어느 회원님이 실화 아니냐고 하셔서 답합니다. 제목 그대로 즉흥적으로 쓰고 있는 픽션이고, 오늘 오전에 1화를 썼고, 방금 2화를 썼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명은 포익틀랜더 클럽과 라이카클럽의 회원들인데, 다 제가 친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와 아무 상관없이 이름만 빌려쓴 것이고, 소설 속에서도 나이, 직업, 상황 등이 모두 실제 회원님들의 그것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분들 실명을 주인공들 이름으로 삼은 건, 많지 않을 두 클럽의 독자분들이 좀 더 실감나게- 머리속에서 그림이 떠오르는 것처럼 읽어나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좀 한가해서 두 편을 연이어 쓸 수 있었는데... 3편도 가능한 빨리 쓰겠습니다.)
종범이 마시던 커피잔을 덜컥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은 것은 양지가 가방에서 꺼낸 반짝이는 은색 카메라 때문이었다.
"어,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나긴~ 샀죠~ 왜, 난 M4 사면 안돼요?"
예의 그 헤헤거리는 웃음을 입가에 매달고 양지가 웃었다. 종범은 말없이 손을 내밀어 카메라를 보자는 뜻을 전했다. 양지는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았다.
"보기만 해요. 손대진 말고. 내꺼니까. 헤헤"
카메라는 실버크롬 M4였다. 볼커나이트가 몇 군데 작게 떨어져나갔고 스트랩에 쓸린 측면의 자국이며 상판에 노출계 착탈 흔적이 제법 크게 있는 등 군데군데 흠이 있었지만, 세월을 감안하면 비교적 깨끗하다 할 만한 실사용기 상태였다
"돈이 어디서 나서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다 종범은 말을 멈췄다. 양지에게 돈 얘기를 하는 건 그녀를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언제나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양지는 전혀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다. 대학을 다닐 때도 친구들은 그녀를 유복한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막내딸이라고 생각했다. 옷 한 벌을 입어도 깔끔하고 센스있게 입고, 어떤 상황에서도 구김없고 밝은 표정의 그녀를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샀어요. 그냥 가지고 싶어져서"
양지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말했다. 가지고 싶어서 샀다는 데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M4를 가지고 싶어한 건 종범이었다. 다른 사람 앞에선 과묵해도 양지에겐 가끔씩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펼치곤 했다. 버쓰이어(Birth-year) 바디의 의미며, 라이카 M 라인업에서 M4가 차지하는 위치며, 소량 만들어진 블랙 페인트 바디의 아름다움이며.... 이런 얘기를 할때면 내성적인 종범의 얼굴에서 어떤 빛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양지는 느꼈다. 그리고 왜 종범이 그렇게 버쓰이어 바디에 집착하는지도.
"이거, 1969년에 만들어진 거에요"
어떤 감정이 실린 건지 종잡기 힘든 목소리로 양지가 말했을 때 종범은 놀라기보다 궁금해졌다. 이 철없는 아가씨가 왜 그토록 자신이 갈망하던 카메라를 들고 나타난 건지.
"아저씨에겐 버쓰이어 바디가 자신과 함께 나이 먹어가는, 함께 세상의 가장자리로 서서히 밀려가는, 그 속도를 눈물나게 실감하게 해주는 길벗이라고 했잖아요?"
종범은 대답 없이 양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나한테는 말이에요, 이 1969년산 카메라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남자의 모든 것, 그중에서 그 남자가 태어난 해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걸, 그 시간까지도 사랑한다는 걸 뜻하는 거에요"
종범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건 제가 가진 거에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만지지 마세요. 이건 아저씨니까. 아저씨가 아저씨를 만지는 건 이상하잖아....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게 되면, 내가 아저씨 길벗이 되면, 그때 아저씨한테 드릴께요. 그때 이 M4는 더 이상 아저씨가 아니라 아저씨를 선택한 나-에요"
그 사단이 있고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여자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종범은 어른인 자신이 뭐라고 정리하지 못하는 일을 스물다섯살 짜리 이 아이가 이렇게 단호하게 정리해버리는 게 놀라웠다. 그렇게 놀라고 나자 이번엔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식도 아래쯤, 명치께를 중심으로 확 퍼져나갔다.
이틀전, 양지의 어머니도 비슷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양지의 단호함은 핏줄을 타고 전해진 걸지도 몰랐다. 양지의 어머니는 세가지를 물었고, 종범은 서른 여덟살이다, 작은 중소기업 홍보실에서 일한다, 모아둔 큰 돈이나 특별한 인생계획은 없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었다. 양지의 어머니는 또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가난하다, 당신이 알고있는 것보다 세 배는 더 가난하다. 이 가난 속에서도 딸 하나 잘 키워 행복하게 해주리라는 기대가 우리 부부의 유일한 꿈이고 낙이었다. 그게 우리를 버티게 했다. 띠동갑 하고도 한 살 더 많은 남자, 그것도 모아둔 것 하나 없는 월급쟁이에게 맡기기엔 딸아이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무겁다. 그 무게는 우리 가족이 건 꿈의 무게다....
양지에게서 듣지 못한 말은 하나도 없었다. 들었던 그대로의 상황이고, 들었던 그대로의 어머니였다. 그런데도 종범은 이길 수 없었다. 조건이나 상황을 이길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가족이 걸고 있는 꿈의 무게를 이길 수 없었다. 그에 비하면 자칭 양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절대적격자- 성호의 억지는 들어줄 만 했다. 아, 그 녀석이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었지.....
"처음 뵙겠습니다. 슈펠타라고 합니다"
"네, 스카라고 합니다. 문종범입니다"
"동안이시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대충은 알고 있는데"
"네, 슈펠타님은 어떻게 되시는지.....?"
"82년생입니다. 양지랑 동갑입니다"
동.갑.이라는 말에 방점이라도 찍힌 것처럼 성호는 한자씩 또박또박 끊어 그 단어를 발음했다. 아니, 그건 종범에게만 들린 환청일지도 모른다. 좀전부터 현기증 비슷한 작은 충격에 깜짝깜짝 놀라던 종범은 정신을 다잡으려고 별 의미없이 카메라가방을 만지작거렸다.
"좋은 가방 쓰시네요. F6..... 역시 연륜이 느껴지네요. 돔케는 낡을수록 진국이라더니"
성호의 옆 의자에 놓여있는 가방을 보니 아티산&아티스트의 최신 모델이었다. 얇고 가벼운 천에 고급스런 가죽을 덧댄. 종범은 낡아빠진 자신의 F6를 한 번 보고 다시 성호의 A&A 가방을 한 번 보곤 하였다. 눈에 보이는 바깥쪽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안쪽을 드러낸다. 세상은 그런 상징의 총합이다. 종범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였다. 이 순간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종범은 억지로 고개를 흔들었지만, 한 번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생식세포의 무서운 속도로 증식하더니, 나중엔 머리 속을 가득 채울 만큼, 그를 통째로 잡아먹을 만큼 커졌다.
"무슨 생각 해요? 버쓰이어 바디에 홀렸어요?"
얄미운, 하지만 조금 걱정스러운 눈으로 양지가 물었다.
"아니"
거짓말 못하는 종범은 곧 덧붙엿다.
"성호 생각. 그냥."
이번엔 양지가 입을 닫았다.
커피가 하릴 없이 식어갔다. 아예 커피잔 손잡이까지 식어버렸다.
정작 해서 안될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니었다, 가난 이야기가 아니었다.
매번 그랬지만, 이번에도 종범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양지는 느릿느릿, 하지만 세밀한 손길로 가방에 M4를 집어넣고, 핸드폰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저씬 그렇게 오래 가지고 싶어했으면서도 아직도 버쓰이어 바디를 가지지 못했죠?"
"...."
"하지만 난 가지고 싶어하는 순간 바로 이렇게 가졌어요. 이게 아저씨와 저의 차이에요"
양지가 빠르게 말을 이었다.
".... 정확히 말하자면, 아저씨와 아저씨가 생각하는 가짜 아저씨의 차이에요. 아저씨가 아저씨 자신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껍데기일 뿐인 가짜 아저씨...."
종범이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양지가 말했다.
"아저씨는..... 내가 가지고 싶기는 해요?"
"어..... 너 무슨 말을 그렇게 막 하냐. 그걸 몰라서 묻니. 우린 당연히... 벌써..."
양지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같이 자는 거 말구요, 아저씨의 양심, 아저씨의 죄책감, 아저씨의 이성, 이런 거 다 놓고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싶냐구요"
"...."
"아저씬 나와 잘 순 있지만 나를 가지진 못했지요. 버쓰이어 M4를 가지지 못한 것처럼. 그건 늘 아저씨의 껍데기가 아저씨를 이기기 때문이지요"
양지가 야무지게 입술을 깨물었다.
"난 그걸 알아요"
양지가 휙 [53-22]의 문을 나섰다. 한동안 종범은, 눈 앞에서 사라진 게 양지인지, 실버크롬 M4인지 확신할 수 없어 반쯤 일어나다 만 어설픈 자세로 테이블을 짚고 서있었다. 갑자기 뱃속에서 말이 쏟아져 나왔다. 야!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스물다섯살 짜리가 어떻게 알아!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말을 한 바가지 넘게 쏟아내고야, 비로소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이 년 동안 단단히 붙잡고 있던 눈물이었다.
그때였다. 주인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실례지만 혹시....."
.......to be continued
(아래 어느 회원님이 실화 아니냐고 하셔서 답합니다. 제목 그대로 즉흥적으로 쓰고 있는 픽션이고, 오늘 오전에 1화를 썼고, 방금 2화를 썼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명은 포익틀랜더 클럽과 라이카클럽의 회원들인데, 다 제가 친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와 아무 상관없이 이름만 빌려쓴 것이고, 소설 속에서도 나이, 직업, 상황 등이 모두 실제 회원님들의 그것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분들 실명을 주인공들 이름으로 삼은 건, 많지 않을 두 클럽의 독자분들이 좀 더 실감나게- 머리속에서 그림이 떠오르는 것처럼 읽어나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좀 한가해서 두 편을 연이어 쓸 수 있었는데... 3편도 가능한 빨리 쓰겠습니다.)
추천 0
댓글목록
최준석님의 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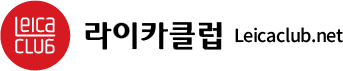 최준석
최준석
진열장에 곱게 전시된 m4를 보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주인공 종범 처럼 아주 먼 미래의 꿈과 같이 갈망하지만
그 꿈이라도 나지막 하게 꾸는 낙으로 삽니다.
금방 이루어져 버리면 혹 식상해 버릴 것 같고
꿈은 꿈일때가 더 좋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 모습은
스물다섯살 짜리가 금방 차갑게 거어버리고 결정해 버리는 모습보다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주인공 종범을 너무 닮아 있기 때문인가 봅니다.
* 재미나게 읽어심다. 감정이입 팍팍 잘 됩니다.
특히 등장인물과의 현실의 인물과의 싱크로율 100% 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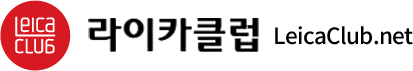
 회원가입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