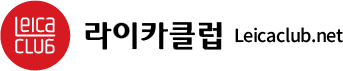사진과 장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성
- 작성일 : 02-08-24 09:13
관련링크
본문
나에게는 4대의 카메라가 있는데, 일제 slr 하나, 독일제 완전수동 하나, 보급형 수동 디지탈카메라 하나, 저가 자동카메라 하나가 그것이다. 사실 작은 자동카메라로 시작해서 짦은 시간 동안 여러 다른 카메라를 거쳐왔다. 그러나 지금만큼이나 카메라의 조합에 만족했던 적은 없다. 딱히 더 바꾸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여유가 된다면 새로운 렌즈나 클래식 카메라 몇 개 정도 더 사보고 싶기는 하다.
덕분에 밖으로 나가기 전 어떤 카메라를 갖고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건 재미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괴로운 일이기도 하다. 사진을 찍게 될 상황이 대충 어떤 것인지 파악하더라도, 막상 접하게 되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때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물이 빽빽히 들어찬 동네에서 접사렌즈가 필요할 것 같다가도, 막상 도착해보니 상당한 광각렌즈가 필요함을 느낄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장비는 작품성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더 좋은 장비가 더 좋은 사진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분명 장비는 촬영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즉, 그것은 표현할 수 있는 범위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사진의 작품성은 어디까지나 이 범위 내에 속한 것이지, '표현의 범위'가 바로 '사진의 작품성'과 등식을 형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장비가 얼마만큼의 표현 범위를 나에게 가져다 주느냐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품성을 추구하면 그만이다. 요새는 Kodak KE30 자동카메라를 종종 들고 다닌다. 워낙 찔끔 찍어대는지라 아직 그 안에 들어있는 필름 한 통도 다 못 찍었지만, 조리개값 F6에 29mm 화각 렌즈를 통해 발견한 표현의 범위는 무궁무진했다. 나의 Rollei 35S도 마찬가지다. 40mm라는 정직한 화각에, 원시적인 노출계 빼고는 모든 표현의 방식을 촬영자에게 내맡기는 '무책임한' 수동카메라이지만, 그 속에서 추구될 수 있는 작품세계의 한계는 인간인 나로서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표현의 범위와 사진의 작품성은 분명 다른 문제다. 더 좋은 카메라가 더 넓은 표현의 범위를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사진의 작품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분명한 착시다. 그리고 종종 자그마한 자동 카메라조차 지독히 넓은 표현의 범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위에서 난 더 좋은 카메라가 더 넓은 표현의 범위를 가져다준다 했지만, 그것은 우열적으로 표현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기에 정정되어 마땅하다. 모든 카메라는 자기만의 독특한 표현 범위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더 넓고 더 작은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의 공간과 시간은 늘 새롭게 탄생하고 있으며, 작은 카메라가 그 중의 일부만 포착한다 하더라도 표현의 범위는 무한대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그 무한대의 표현 범위 속에 작품성이 없을 수 있을까?
거창한 이야기를 실제적인 세계로 다시 담백하게 축소시켜 보자. 날아다니는 철새를 자동카메라 하나로 찍는다는 것은 우스인 일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 달랑 29mm 자동카메라 하나만 든 채 놓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 자동카메라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현의 범위가 그 축을 이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카메라와 그는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 29mm의 화각, 그리고 고급렌즈에 비해 떨어지는 명암이나 색감을 갖고 어떤 독특한 느낌의 사진으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독창적인 사진을 얻어내는 데 자동카메라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즉, 고급 망원 렌즈로 찍은 사진과 자동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시각적 내용물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작품성을 비교해본다면 그다지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진의 좋고 나쁨은 이 작품성과 관련한 것이 아닐런지.
결국 장비는 죽은 것이다. 유일하게 살아 있는 것은 역동적으로 고뇌하는 인간의 의식과 그 열정이다. 그것이 없으면 장비도 없다. 인간의 위대함은 도구를 사용한다는 데 있으며, 장비병은 그 관계를 역전시킬 뿐이다.
나는 장비병을 장난감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위에서 서술한 것은 매우 일부의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카메라가 어렸을 적 갖고 놀던 장난감의 연장선에 있음을 은연중에 의식하고 있다. 부끄러워 할 일은 아니다.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통해 자신을 투여시키고 정신의 여유를 찾아간다는 것은 인간에게 무척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난감병이란 단어는, 사진의 작품성과 장비의 우열성을 분리시켜주는 것 같아 부담없이 느껴진다.
아무튼 사진의 초보 단계에서부터 장비병이 덧없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점에 감사할 뿐이다. 근데 왜 Leica Digilux는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것일까. 이제는 나이를 먹어 누구한테 사달라고 칭얼댈 수도 없고, 큰일이다. 그나마 자동차와 같은 고가 장난감에 매달리지 않음을 신께 감사해야지, 후후.

덕분에 밖으로 나가기 전 어떤 카메라를 갖고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건 재미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괴로운 일이기도 하다. 사진을 찍게 될 상황이 대충 어떤 것인지 파악하더라도, 막상 접하게 되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때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물이 빽빽히 들어찬 동네에서 접사렌즈가 필요할 것 같다가도, 막상 도착해보니 상당한 광각렌즈가 필요함을 느낄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장비는 작품성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더 좋은 장비가 더 좋은 사진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분명 장비는 촬영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즉, 그것은 표현할 수 있는 범위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사진의 작품성은 어디까지나 이 범위 내에 속한 것이지, '표현의 범위'가 바로 '사진의 작품성'과 등식을 형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장비가 얼마만큼의 표현 범위를 나에게 가져다 주느냐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품성을 추구하면 그만이다. 요새는 Kodak KE30 자동카메라를 종종 들고 다닌다. 워낙 찔끔 찍어대는지라 아직 그 안에 들어있는 필름 한 통도 다 못 찍었지만, 조리개값 F6에 29mm 화각 렌즈를 통해 발견한 표현의 범위는 무궁무진했다. 나의 Rollei 35S도 마찬가지다. 40mm라는 정직한 화각에, 원시적인 노출계 빼고는 모든 표현의 방식을 촬영자에게 내맡기는 '무책임한' 수동카메라이지만, 그 속에서 추구될 수 있는 작품세계의 한계는 인간인 나로서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표현의 범위와 사진의 작품성은 분명 다른 문제다. 더 좋은 카메라가 더 넓은 표현의 범위를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사진의 작품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분명한 착시다. 그리고 종종 자그마한 자동 카메라조차 지독히 넓은 표현의 범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위에서 난 더 좋은 카메라가 더 넓은 표현의 범위를 가져다준다 했지만, 그것은 우열적으로 표현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기에 정정되어 마땅하다. 모든 카메라는 자기만의 독특한 표현 범위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더 넓고 더 작은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의 공간과 시간은 늘 새롭게 탄생하고 있으며, 작은 카메라가 그 중의 일부만 포착한다 하더라도 표현의 범위는 무한대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그 무한대의 표현 범위 속에 작품성이 없을 수 있을까?
거창한 이야기를 실제적인 세계로 다시 담백하게 축소시켜 보자. 날아다니는 철새를 자동카메라 하나로 찍는다는 것은 우스인 일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 달랑 29mm 자동카메라 하나만 든 채 놓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 자동카메라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현의 범위가 그 축을 이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카메라와 그는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 29mm의 화각, 그리고 고급렌즈에 비해 떨어지는 명암이나 색감을 갖고 어떤 독특한 느낌의 사진으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독창적인 사진을 얻어내는 데 자동카메라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즉, 고급 망원 렌즈로 찍은 사진과 자동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시각적 내용물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작품성을 비교해본다면 그다지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진의 좋고 나쁨은 이 작품성과 관련한 것이 아닐런지.
결국 장비는 죽은 것이다. 유일하게 살아 있는 것은 역동적으로 고뇌하는 인간의 의식과 그 열정이다. 그것이 없으면 장비도 없다. 인간의 위대함은 도구를 사용한다는 데 있으며, 장비병은 그 관계를 역전시킬 뿐이다.
나는 장비병을 장난감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위에서 서술한 것은 매우 일부의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카메라가 어렸을 적 갖고 놀던 장난감의 연장선에 있음을 은연중에 의식하고 있다. 부끄러워 할 일은 아니다.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통해 자신을 투여시키고 정신의 여유를 찾아간다는 것은 인간에게 무척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난감병이란 단어는, 사진의 작품성과 장비의 우열성을 분리시켜주는 것 같아 부담없이 느껴진다.
아무튼 사진의 초보 단계에서부터 장비병이 덧없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점에 감사할 뿐이다. 근데 왜 Leica Digilux는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것일까. 이제는 나이를 먹어 누구한테 사달라고 칭얼댈 수도 없고, 큰일이다. 그나마 자동차와 같은 고가 장난감에 매달리지 않음을 신께 감사해야지, 후후.

추천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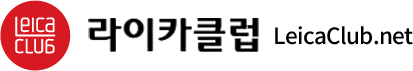
 회원가입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