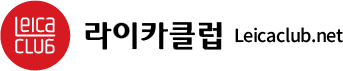인연이었던 카메라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 용 욱
- 작성일 : 08-07-14 20:18
관련링크
본문
이 글을 쓰게 된건
제가 어쩌다가 사진에 흥미를 갖게 됐을까.. 하는걸 생각 하면서부터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첫번째 카메라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나.. 3학년때였나..
아버지가 사오신 니콘의 FM2 였네요..
그전까진 집에 카메라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한개 사야지 사야지 하고계시다가 어느날 귀국하시는 길에
커다란 망원렌즈가 달린 니콘의 그녀석을 사들고 오신거죠.
그때가 80년대 초였어요.
집이 그다지 부유한건 아니었는데 직업이 외항선원이다 보니
오며 가며 봐두셨던 니콘을 사오셨나봐요 그때만해도 니콘이 최고인줄 알던 때였거든요.
집에 들여온 카메라는 그 뒤로 아버지가 다시 해외로 나가시면 장롱안에 고이 모셔져서
동생과 어머니와 나들이갈때 쓸수 있을만큼 호락호락한 카메라는 아니었던거죠.
어머니는 이 카메라를 팔고 그냥 쓰기편한 자동카메라나 한개 사오라고 아버지한테 압력을 가했고.
아버지도 그전까지 사진을 그닥 찍어본분이 아니라서 곰곰히 생각 하다가 처분을 하셨던거죠.
그 카메라에 찍힌 사진이 아직 집에 있긴 한데 몇장 되지 않는걸로 봐서는 어지간히 쓰기가 편하지 않았나봐요.
그걸 처분하기 전엔 혼자 집을 지킬때는 어른들 몰래 그걸 꺼내들고는 이리저리 만져보고
공셔터를 날려보고 그러다가 어른들 오실 시간이 되면 흔적도 없이 놓어두곤 했었네요.
그게 저와 카메라라는 기계의 첫 인연인듯 하네요.
그 후로 집에 들어온 녀석은 역시나 니콘의 자동카메라인 L35 AD2 라는 완전 자동카메라였어요.
요즘 자동카메라들은 워낙 컴팩트해서 비교가 안되지만..FM2에 비하면 정말 앙증맞았죠.
그 카메라를 얼마전까지 썼었어요.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졸업식, 수학여행, 고등학교 졸업때 까지..
그 카메라로 찍힌 우리집의 역사들이 수도없이 많긴 해요.. 그만큼 쓰기는 편했던거죠.
그러다가 군제대를 하고 카메라엔 별 관심이 없던 무렵..
친구가 가방에서 뭘 꺼내들며 자랑을 하는거예요.. "엥.. 그게 뭐냐?"
친구가 꺼내든건 니콘의 보급형 SLR인 F60이었죠..
그전까진 AF기능이 뭔지도 모르고 반셔터를 누를때마다 자동으로 윙윙 돌아가는 그 렌즈가
어찌나 신기해보였는지..
그러다가 디지털 카메라의 붐이 시작되더군요.
친구는 쓰기불편하고 덩치가 큰 SLR보다 당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니콘의 쿨픽스 2500에 관심을 갖더군요.
그땐 아직 DSLR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나는 그친구에게 F60을 넘겨라.. 라고 압박을 가했고 결국 20장을 주고 넘겨 받았죠..ㅋㅋ
그게 저의 첫 카메라네요..
포트폴리오촬영부터 여자친구의 모습들도 담아보고 집 주위의 소소한것들까지 제법 찍어댔죠.
그러다가 그것도 잠시.. 그 카메라와의 인연이 다 됐는지.. 주고싶은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 뒤로 한참동안 카메라가 없었네요
디지털 카메라가 속속 발표가 되고. 디카의 춘추전국시대라 불릴만한 시기에도
이상하게 디카에는 별 관심이 안생기더라구요..
그렇게 몇년..
제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친구가 귀국 하겠다는 연락을 메신져로 받으며 그친구가 선물을 줄테니 둘중에 한개 골라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Rollei35T, Olympus pen ee3... 둘중에 고르라는거예요..
망설임 없이 롤라이를 골랐죠. 테사렌즈가 박힌 싱가폴제였지만.
석달 후.. 그걸 받아든 그순간 정말 그 카메라에 대한 그 어떤 이질감이나 낯설음도 없이
그렇게 롤라이는 저의 애장품 1호가 됐습니다.
필름을 일단 한롤 먹여주고 이제 막 벚꽃이 피기 시작한 광안리로 달려갔어요.
천천히 조리개를 개방하고 셔터 스피드 다이얼을 돌려서 노출계를 맞춘다음 눈으로 거리를 가늠해서..
한컷.. 두컷.. 그렇게 순식간에 36방짜리 필름을 털어버렸네요..
아직 사진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을 때였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도 몰랐구요.. 롤라이 카메라의 명성만 들었지 결과물을 본적도 없었거든요..
인화는 생각도 안하고 30분만에 현상에서 스캔까지 끝마쳐주는 칼라현상소를 찾아서
필름을 맡겼었죠...
씨디를 받아들고 집에와서 캄퓨터에 돌려봤더니...
이 손바닥만한 카메라가 담을수 있는것이 정녕 이런 세상이었나 싶을정도로 사진에 대한
만족감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후로 지금까지 저의 주력 카메라는 Rollei 35 T입니다.
그러다가 라이카를 알게 된거죠.
뭐 물론 그전부터 라이카의 엄청난 포스를 모르는건 아니었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꿈도 못꾸다가.. 슬슬 꿈을 꿀수있게 된거라고나 할까요..
제가 눈독을 들인건 M3도 M8도 M6도 아니었습니다.
바르낙 디자인의 IIIf와 침동식렌즈 L마운트 렌즈군이 눈에 띄게 된거죠.
오랜 시간을 장터에서 매복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짜이즈이콘의 콘타플랙스가 저를 잠시 유혹 하기도 했는데
지인의 짜이즈이콘을 하루 빌려보고는 미련을 버렸죠.
몇번을 입찰에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실패하고..
"아.. 나는 이 카메라와 인연이 없는건가..." 라고 생각하던 시간이 몇개월 흘렀습니다.
어느날.. 아침.. 묘하게 모 클럽의 중고장터를 클릭 하게 됐는데..
너무나 상태가 좋은 IIIf와 Summitar렌즈가 눈에 띄는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몇일뒤.. 그 바르낙바디의 카메라는 롤라이와 사이좋게 나란히 두고 볼수 있게됐죠.
노출계가 없는 바르낙... 거리계가 없는 롤라이..
남들이 보기엔 그닥 좋을게 없는 몇몇 풍경들을 담아내고는 저 스스로 만족하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
제가 어쩌다가 사진에 흥미를 갖게 됐을까.. 하는걸 생각 하면서부터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첫번째 카메라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나.. 3학년때였나..
아버지가 사오신 니콘의 FM2 였네요..
그전까진 집에 카메라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한개 사야지 사야지 하고계시다가 어느날 귀국하시는 길에
커다란 망원렌즈가 달린 니콘의 그녀석을 사들고 오신거죠.
그때가 80년대 초였어요.
집이 그다지 부유한건 아니었는데 직업이 외항선원이다 보니
오며 가며 봐두셨던 니콘을 사오셨나봐요 그때만해도 니콘이 최고인줄 알던 때였거든요.
집에 들여온 카메라는 그 뒤로 아버지가 다시 해외로 나가시면 장롱안에 고이 모셔져서
동생과 어머니와 나들이갈때 쓸수 있을만큼 호락호락한 카메라는 아니었던거죠.
어머니는 이 카메라를 팔고 그냥 쓰기편한 자동카메라나 한개 사오라고 아버지한테 압력을 가했고.
아버지도 그전까지 사진을 그닥 찍어본분이 아니라서 곰곰히 생각 하다가 처분을 하셨던거죠.
그 카메라에 찍힌 사진이 아직 집에 있긴 한데 몇장 되지 않는걸로 봐서는 어지간히 쓰기가 편하지 않았나봐요.
그걸 처분하기 전엔 혼자 집을 지킬때는 어른들 몰래 그걸 꺼내들고는 이리저리 만져보고
공셔터를 날려보고 그러다가 어른들 오실 시간이 되면 흔적도 없이 놓어두곤 했었네요.
그게 저와 카메라라는 기계의 첫 인연인듯 하네요.
그 후로 집에 들어온 녀석은 역시나 니콘의 자동카메라인 L35 AD2 라는 완전 자동카메라였어요.
요즘 자동카메라들은 워낙 컴팩트해서 비교가 안되지만..FM2에 비하면 정말 앙증맞았죠.
그 카메라를 얼마전까지 썼었어요.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졸업식, 수학여행, 고등학교 졸업때 까지..
그 카메라로 찍힌 우리집의 역사들이 수도없이 많긴 해요.. 그만큼 쓰기는 편했던거죠.
그러다가 군제대를 하고 카메라엔 별 관심이 없던 무렵..
친구가 가방에서 뭘 꺼내들며 자랑을 하는거예요.. "엥.. 그게 뭐냐?"
친구가 꺼내든건 니콘의 보급형 SLR인 F60이었죠..
그전까진 AF기능이 뭔지도 모르고 반셔터를 누를때마다 자동으로 윙윙 돌아가는 그 렌즈가
어찌나 신기해보였는지..
그러다가 디지털 카메라의 붐이 시작되더군요.
친구는 쓰기불편하고 덩치가 큰 SLR보다 당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니콘의 쿨픽스 2500에 관심을 갖더군요.
그땐 아직 DSLR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나는 그친구에게 F60을 넘겨라.. 라고 압박을 가했고 결국 20장을 주고 넘겨 받았죠..ㅋㅋ
그게 저의 첫 카메라네요..
포트폴리오촬영부터 여자친구의 모습들도 담아보고 집 주위의 소소한것들까지 제법 찍어댔죠.
그러다가 그것도 잠시.. 그 카메라와의 인연이 다 됐는지.. 주고싶은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 뒤로 한참동안 카메라가 없었네요
디지털 카메라가 속속 발표가 되고. 디카의 춘추전국시대라 불릴만한 시기에도
이상하게 디카에는 별 관심이 안생기더라구요..
그렇게 몇년..
제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친구가 귀국 하겠다는 연락을 메신져로 받으며 그친구가 선물을 줄테니 둘중에 한개 골라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Rollei35T, Olympus pen ee3... 둘중에 고르라는거예요..
망설임 없이 롤라이를 골랐죠. 테사렌즈가 박힌 싱가폴제였지만.
석달 후.. 그걸 받아든 그순간 정말 그 카메라에 대한 그 어떤 이질감이나 낯설음도 없이
그렇게 롤라이는 저의 애장품 1호가 됐습니다.
필름을 일단 한롤 먹여주고 이제 막 벚꽃이 피기 시작한 광안리로 달려갔어요.
천천히 조리개를 개방하고 셔터 스피드 다이얼을 돌려서 노출계를 맞춘다음 눈으로 거리를 가늠해서..
한컷.. 두컷.. 그렇게 순식간에 36방짜리 필름을 털어버렸네요..
아직 사진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을 때였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도 몰랐구요.. 롤라이 카메라의 명성만 들었지 결과물을 본적도 없었거든요..
인화는 생각도 안하고 30분만에 현상에서 스캔까지 끝마쳐주는 칼라현상소를 찾아서
필름을 맡겼었죠...
씨디를 받아들고 집에와서 캄퓨터에 돌려봤더니...
이 손바닥만한 카메라가 담을수 있는것이 정녕 이런 세상이었나 싶을정도로 사진에 대한
만족감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후로 지금까지 저의 주력 카메라는 Rollei 35 T입니다.
그러다가 라이카를 알게 된거죠.
뭐 물론 그전부터 라이카의 엄청난 포스를 모르는건 아니었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꿈도 못꾸다가.. 슬슬 꿈을 꿀수있게 된거라고나 할까요..
제가 눈독을 들인건 M3도 M8도 M6도 아니었습니다.
바르낙 디자인의 IIIf와 침동식렌즈 L마운트 렌즈군이 눈에 띄게 된거죠.
오랜 시간을 장터에서 매복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짜이즈이콘의 콘타플랙스가 저를 잠시 유혹 하기도 했는데
지인의 짜이즈이콘을 하루 빌려보고는 미련을 버렸죠.
몇번을 입찰에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실패하고..
"아.. 나는 이 카메라와 인연이 없는건가..." 라고 생각하던 시간이 몇개월 흘렀습니다.
어느날.. 아침.. 묘하게 모 클럽의 중고장터를 클릭 하게 됐는데..
너무나 상태가 좋은 IIIf와 Summitar렌즈가 눈에 띄는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몇일뒤.. 그 바르낙바디의 카메라는 롤라이와 사이좋게 나란히 두고 볼수 있게됐죠.
노출계가 없는 바르낙... 거리계가 없는 롤라이..
남들이 보기엔 그닥 좋을게 없는 몇몇 풍경들을 담아내고는 저 스스로 만족하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
추천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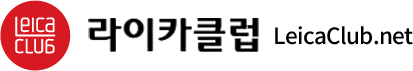
 회원가입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