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STONE & ROCK 김영길 사진展 - 갤러리룩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오중
- 작성일 : 02-12-30 11:21
관련링크
본문


STONE & ROCK
김영길 사진展
2002_1225 ▶ 2003_0107 / 1월 1일 휴관
초대일시_2002_1226_목요일_05:00pm
갤러리 룩스
서울 종로구 관훈동 인덕빌딩 3층
Tel. 02_720_8488
물고기의 혼 : 신화, 애니미즘 그리고 이미지 ● 사물에는 영혼이 존재하고, 사물들이 죽으면 그 영혼들은 영원히 또 다른 형상으로 세상에 남는다는 믿음이 만유정령설이다.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문명 자체가 미개했던 원시시대로 갈수록 이러한 만유정령의 신화들과 마주치기란 어렵지 않다. 모든 나라의 역사 신화, 종교 신화 그리고 구복 신화는 만유정령설이고, 이것들이 애니미즘으로, 토템으로, 샤머니즘으로 진보해서 나아간다. 역사 신화란 그런 점에서 불멸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이며, 불멸의 영혼이 주제로써 나타난 것이 설화이다. 따라서 설화의 원천은 신화였고, 신화는 롤랑 바르트에 따른다면 인간이 언어를 만들어 낸 후 맨 먼저 꺼내 들었던 이야기 소재이다. 그래서 바르트는 ‘죽음’을 신화의 원천으로 보았다. 정령(精靈)의 살아 있음과 죽음, 그것을 교직하는 주제, 소재, 대상은 역시 한 발짝도 신화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신화의 시작과 끝은 늘 살아 있음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죽음이 두려워 만들었다는 종교도, 영원히 죽지 않게 해 달라는 영혼불멸의 토템도, 신에게 생로병사를 물었던 샤머니즘도 죽음이 뒤에 있다. 이렇듯 언제나 신화는 죽음을 전제로 하는 변함없는 신화의 패러다임이자 신화의 카테고리이다.
애니미즘은 그 가운데서도 생물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생각과 신앙을 말한다. 애니미즘의 “아니마(anima)”는 라틴어로 영혼이다. 원시시대로 갈수록 살아 있는 것과 죽는 것, 변하는 것과 변화지 않는 생물에 대한 다양한 애니미즘의 인식들이 자리했다. 이러한 애니미즘은 인간 지능의 진보, 문명적 개화, 그리고 경험의 축적에 따라 그 대상들을 달리 해왔다. 인간과 자연물 사이에 하등의 본질적인 구별을 두지 않았던 때, 동식물들도, 우주 삼라만상도, 인간도, 모두 영혼과 정령을 가진다고 보았던 초기 애니미즘의 근저는 당연히 ‘물고기’였다. 수렵과 농경 중심 사회로의 진입하기 이전까지 애니미즘의 근저는 어류였던 것이다. 어류는 생명의 가장 중요 원소인 ‘물(水)’의 상징이었으므로 물고기가 애니미즘 신화의 중심에 자리 잡았던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물고기를 인간과 똑같은 정령으로 보았고, 인간이 죽으면 물고기가 되거나, 물고기의 “탈”을 쓰고 영혼불멸의 자연화로 되어진다고 보았다. “바위”는 바로 그 자연화의 상징이었다. 바위가 신화와 설화의 근간이 되었던 것도, 애니미즘, 토템, 샤머니즘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구복(求福)의 믿음과 다산(多産)의 제단(祭壇)이 되었던 것도, 그리고 길흉, 생로병사, 신탁을 의뢰했던 것도 불멸의 “아니마” 때문이었다.
김영길의 사진은 한국적 신화, 설화를 테제로 한 애니미즘의 형상화이다. 사진 이미지는 ‘물고기’를 닮은 ‘바위’ 형상이다. 인간과 물고기가 넋을 공유한다는 물고기에 대한 한국적 애니미즘을 차용하여 바위에서 그것들의 상징성을 찾고 있다. 역사 신화에서 혹은 민간 설화에서 물고기와 관련된 것들은 너무도 많다. 그 가운데서도 “거북”은 가장 중심이 되는 영혼불멸, 불로장생의 신화소이다. 애니미즘, 토템, 샤머니즘에 관해서라면 어느 나라 못지않게 풍부한 나라가 우리이다. “무슨 바위가 무엇을 닮았다”는 전설 정도는 어느 지역, 어느 고을을 가더라도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다.
김영길은 애니미즘의 형상화를 위해 설화의 원전을 들춘다. 그중 하나가 김수로왕이다. 수로왕의 신화는 역사 신화 중에서 가장 극적으로 물고기, 용왕(龍王), 옥지(玉池)를 등장시킨 물과 어류의 신화적 원전이다. 옛날 옛적 하늘에서 알이 바닷가로 떨어지니 사람으로 되고 나라를 통치하였다는 김수로왕의 전설. 신라 왕국에는 옥지란 못이 있고 그 못에서 독룡이 살았다는 전설. 물고기가 떼로 살았던 만어산(萬漁山)이며, 동해의 물고기와 동해의 용들이 모두 바위의 형상으로 변했다는 한국적 애니미즘이 김영길 사진의 원전이 되고 있다. 애니미즘이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현재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도 현재화되는 구복적(예를 들면 불교 사찰에서 방생, 수미단, 어북, 풍경쇠의 이미지), 구원적(기독교에서 예수의 물고기, 생명수, 부활의 증표) 애니미즘 신화는 특히 종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영길의 사진도 신화의 현재화가 모티브이다. 물고기, 바위가 신성, 정령의 의미를 띠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롤랑 바르트가 「신화론」에서 말했던 신화의 현재화 방식, 즉 신화란 오늘에 어떤 의미인가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트가 신화의 현재화에서 의미 있게 바라본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신화적 ‘부재’이고, 다른 하나는 신화적 ‘시선’이다. 그것은 메타적인 것이다. 김영길이 사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도 신화의 현재성이다. 우리에게 보여주려 한 것이 그저 ‘바위의 특정 모습이 물고기를 닮았네’도 아니고, ‘옛날 옛적에 물고기들이 바위가 되었다’는 것도 아니다. 작가 스스로 말했던, “물고기들은 잠을 잘 때 눈을 감지 않는다.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는다. 그래서 산사(山寺) 풍경의 추는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다. 늘 깨어 있으라고. 육체의 눈, 곧 얼굴의 두 눈은 늘 깨어 있을 수 없다. 휴식도 필요하다. 그러나 영혼의 눈, 곧 마음의 눈은 늘 깨어 있을 수 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미움에서 사랑이,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이 보인다.” 에서 말하는 신화의 현재성이다. ■ 진동선
댓글목록
권오중님의 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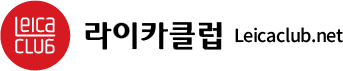 권오중
권오중
전시장에 걸려 있는 사진은 제목그대로 ' STONE & ROCK ' 이다 .
돌덩어리와 바위산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보려 함인가 ?
전체를 둘러보면 무언가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보여진다 .
의미를 가져가고 형상화되지않으면 불편해하는 심리적 층위의 얇음 때문인지도
모르는 작가가 물고기 형상화를 통하여 자연 속에 숨겨진 애니미즘을 통한
범신론적인 부분을 들추어 낸다는 해석을 빠르게 가져가기 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저 즉물적인 화법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 .
흑백의 화면이 만들어 내는 것은 그저 돌덩어리일 뿐이다 .
돌덩어리의 거침이 다소 포커스가 안맞는 듯 조금 흔들린 듯
그런 화면 속에서 보여지지만 그건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볼라치면 감상에 그리 문제되지는않는다 .
돌덩어리에는 봄 날에 떨어지는 작은 꽃 잎과도 같은 꽃 무늬로
표면이 바람과 시간에 따라 들고 일어나 있어 돌 표면의 거침과 더불어 무언의 아우성처럼 보이기도 한다 .
그런 가운데 강하게 시선을 끌고 있는 것이 있으니
움푹 패여진 부분에 고인 물이다 .
시선이 고정되고 한참을 보게 만들더니 그를 통하여 물고기의 신화를 읽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내 눈에는 프레임 하단에 꽤 넓게 자리하고 있는 검은 그림자가 물고기의 눈으로 읽혀지는 움푹들어간 부분과
입처럼 느껴지는 엷은 선으로 보여지는 갈라진 바위 틈에 의해서 깊은 우물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
어두운 그림자 아니 어둠이 이처럼 깊이를 가질 수 있다니 ....
즉물적 묘사를 통한 자연 속의 하나의 피사체인 바위의 거침과 형상 뒤에
숨겨진 것은 끝도없는 어둠의 깊이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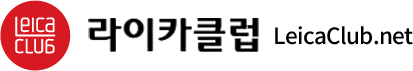
 회원가입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인